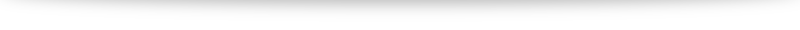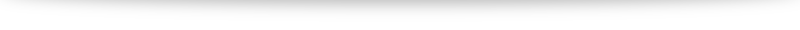오늘 책장에 책을 채웠다. 그리고, 빈 상자는 아이들의 즐거운 장난감으로 다시 태어났다. 남들이 보면, 이 집은 장난감 안 사주고, 별 걸 다 가지고 논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다. 지난 번 가방에 이어 상자다.
아빠, 내 자동차야.
내 껀 지붕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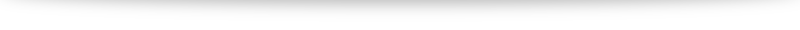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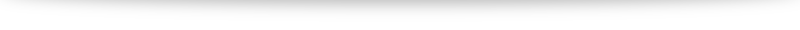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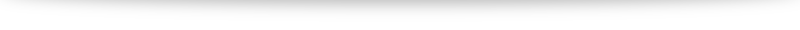
오늘 출근하는 시간에 큰아들 창선이가 내 구두를 닦아줬다. ‘아빠 구두를 닦아야 하는데, 아빠는 언제 오냐?’며 어제부터 성화였다고 애엄마가 얘기해 줬다.
현관을 나서려니 아들 두 놈이 나란히 인사를 했다. 작은아들은 만 한 살인데도 제법 인사를 잘 했다. 어찌나 기쁜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