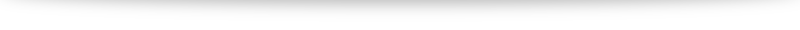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은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단체장은 지역을 위한 정책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명분 또는 이미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자리이다.
아래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이후 1달이 지난 다음 나온 사설이다.
깨끗한 ‘이미지’라며 음양으로 밀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준비가 안 된 모습’이라며 질타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씁슬한 뒷맛이 난다.
[#M_[중앙일보사설] 취임 한 달 지나도 보이지 않는 서울시장|봤어요…|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시정 계획을 짜고 공직사회에 변화를 이끌고 수해를 챙기고 나름대로 바쁜 한 달을 보냈다고 자평하는 것 같다. 하지만 관심이 갈 만한 구체적인 정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이미지 정치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 보니 서울 경쟁력 강화, 브랜드 강화라는 추상적인 구호가 앞선다. 오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100일 창의서울 추진본부’를 만들어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구했지만 별로 나온 게 없다. 또 공약을 담당할 3개의 본부를 신설했지만 결과물은 없고 회의로 밤을 새우고 있다고 한다. 연간 관광객을 6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공무원도 회의적인 눈길을 보낼 정도다.
오 시장이 주력하는 분야가 환경이다. 대기오염을 도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교통환경유발부담금 제도를 내놨다. 하지만 경유차 소유자의 30~40%가 소형 트럭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정책 혼선도 엿보인다. 의견 수렴 없이 어린이대공원 담장을 철거한다고 발표해 반발을 사고 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련,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재검토하는 것도 행정의 일관성을 떨어뜨린다.
이미지에 의존하는 모습은 여전하다. 10월에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겠다는데 자칫하다간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공무원과 선상 토론을 벌이고 영화를 같이 보는 모습도 이벤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 시장은 “6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하나 임기 4년은 그리 길지 않다. 전임 이명박 시장은 취임 다음날 청계천복원본부를 출범시켜 자신의 구상을 바로 정책으로 옮겼다. 정책 구상이 너무 길어지면 ‘준비 안 된 시장’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형국이 될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이미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_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