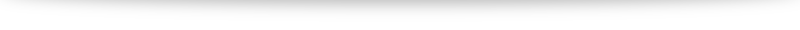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오바마에 대한 생각이 많이 갈리는가보다. 한마디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딱지 붙이기 좋아하는 국내 특성상, ‘자유주의’, ‘좌파’니 하는 말은 이미 외국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쓰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냥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개인적으로 모든 논의(사실 논의도 아니다)의 출발이 ‘좌빨’이냐 아니냐로 시작해야만 하는 한국 현실이 착잡하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22170.html
“오바마는 좌빨 아닌가?”
예상대로 또한 기대대로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물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여 미국이 모순이 증발한 ‘천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극우 네오콘,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근본주의의 복합물이었던 부시
정권에 대하여 미국인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점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그런데 오바마
당선 후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주창하는 오바마 당선인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은
닮은꼴”이라고 말했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둘 다 변화와 개혁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자가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다.오바마의 대선 공약은 이라크 전쟁 반대와 철군,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부자 중심의 세수 증대와 중산층
이하 세금 삭감, 공적 의료보험 제도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증진, 공교육 강화·개선, 북핵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은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좌파’ 정책이라고 핏대를 세우며 비난하지
않았던가. 현재 정부는 이라크 전쟁 계속 참전, 자본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 축소, 1%만 득을 보는 종부세 폐지, 사영리
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의료복지의 편차 확대, 사교육 열풍에 기름을 끼얹는 국제중 설립 추진, 대북 강경책 고수 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런 분명한 차이가 어찌 정치적 수사로 가려질 수 있겠는가.한편 오바마 당선 후 한국의 보수진영은 오바마의 정치성향을 자기 입맛대로 규정하고 나섰다. 보수논객 조갑제씨는 오바마는
‘좌파’가 아니라 ‘리버럴’이라고 말하였고, 전여옥 의원은 오바마는 ‘리버럴’도 아니며 ‘아메리칸드림의 신봉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 약간의 개념정리가 필요하다.‘자유주의’, 즉 ‘리버럴리즘’(Liberalism)은 시민의 사상과 행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는 사상이다.
그런데 한국 보수진영이 신봉하는 자유주의는 극우·냉전·반공 이데올로기의 틀에 갇힌 반쪽짜리 자유주의였고, 그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사상과 행동을 처벌하는 사이비 자유주의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전면적 자유를 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꿈을
무시하는 ‘자유 지상주의’, 즉 ‘리버테리어니즘’(Libertarianism)의 현대판 이론이다. 이에 비하여
‘리버럴’(Liberal)은 전통적 자유주의의 가치를 수용함과 동시에 평등과 박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상과 운동을 뜻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연대를 중시하는데, 미국 극우진영은 ‘리버럴=부의 재분배론자=빨갱이’라는 주장을 구사해
왔다.사실 오바마는 2007년 <내셔널 저널> 조사에서 가장 ‘리버럴’한 상원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사상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근친성을 갖는 부시 정부와 찰떡궁합을 과시하던 현 정부와 보수진영은 이런 오바마의 당선에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친미’를 신조로 삼아 왔으니 미국 대통령을 비난할 수는 없고 그 결과 자기모순적 논리를 구사하게 된 것이다. 똑같은 정책을
한국 정치인이 주장하면 ‘빨갱이’가 되고, 미국 정치인이 주장하면 ‘아메리칸드림’이 되니 말이다. 정부와 보수진영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바마의 정치성향을 견강부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거대하게 변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겸허하게 배우고 자신의 정책과 행태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일이다.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